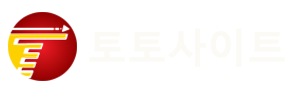군사편찬연구소 조성훈 박사가 6·25전쟁 당시 공산권이 발표한 국군포로 규모를 국군과 유엔군 측 자료와 비교·분석하는 등 6·25 당시 발생했던 국군포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단행본을 발간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미귀환 국군포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북한의 포로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1951년 6월 25일 북한군 총사령부는 국군과 유엔군포로 등의 규모를 108,257명으로 공식발표했다. 그런데 그들은 국군포로 가운데 대다수를 북한군에 입대시키거나 주민으로 편입하기 위해, 이미 1951년 12월 포로 명단을 교환할 때 이들을 아예 제외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국군과 유엔군 포로의 발생 배경, 규모, 포로수용소 위치와 대우, 북한·중국군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사망자, 북한군 편입 과정과 규모를 살펴봤다. 국군포로 외에도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포로의 고통과 희생을 곳곳에 반영하여 그들도 기억하려 애썼다. 또 휴전협상 당시와 정전 후 포로 논쟁과 포로 교환, 미귀환 포로 규모 등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국군포로의 시베리아 이송설과 관련, 가능성을 검토하고 귀환 대책도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공산군의 포로 대우에 관한 보고서, 북한군과 중국군 포로 심문보고서와 함께 북한·중국의 신문과 잡지, 중국군·조선족 참전자 회고록, 러시아 문서를 참고해 설득력을 더했다.
그는 “이번 책을 통해 6·25전쟁 포로와 실종자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서 특히 중국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전쟁 당시 중국군이 ‘조선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 전쟁포로 관리처’를 편성해 공동 운영했기에 전체 포로 규모나 수용 중 북한군 편입 규모, 사망자 등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